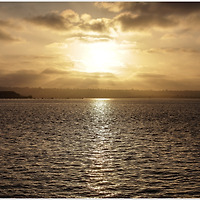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 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사랑법」
강은교 詩選集 『풀잎』(민음사, 1974)
사랑 속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이 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그 바다는 침묵의 대지이다. 커다란 침묵의 힘, 언어의 충만함의 근원, 삶의 질서에 대한 인식의 기저(基低)... 침묵은 분주한 삶의 의미들을 고요한 질서로 만든다. 인(因)과 연(緣)이 가로질러 삶의 의미들을 만들때 그 안에서의 관계들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만나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그 무작위적이지만 질서정연한 삶의 구조들 안에서 침묵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또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접근과 닿아 있다. 언어의 문법적 환상에서 벗어나 만나게 되는 거대한 침묵, 그리고 그 안의 깊은 세계. 나는 당신을 기억하는가. 오래 전의 나에게 묻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가. 묻어두었던 기억의 말들이 굳은 어깨를 들썩이며 천천히 일어선다. 나는 당신에게 오래전의 침묵이었고 먼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 당신이 침묵의 길을 따라 달빛과 진실의 미망(未妄)을 건너 나를 마주하기를, 그래서 당신이 진공(眞空)으로 나를 인도하고 대지가 하늘이 되는 순간만큼 넓고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꿈꾸게 하기를 고요한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다.
시 ‘사랑법’은 긴 기다림 속에서 내 입을 벗어나온 시이다. 그러니까, 시 ‘사랑법’은 기다림의 말이다. 기다림의 말이면서, 어둠의 말이기도 하고, 또 식탁의 말이기도 하다. 그때 그림이 그려진다. 문을 바라보며 앉아, 찌개를 덥히곤 하던 그런 나의 젊은 모습이. 그날 저녁도 아마 그랬었지.
아주 젊은 한 여자가 현관문을 향하여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온갖 신경을 기대고 있다가 하고 있다. 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 여자는 뛰어간다. 베란다로. 베란다의 유리창에 얼굴을 들여다 댄다. 창밖의 색깔은 짙은 까만 색이다.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무슨 헌 데처럼 그 까만 어둠의 천 사이로 벗겨져 있다. 그 여자는 차거운 유리창의 감촉을 느끼며 돌아선다. 먼 찻길 위로 어둠의 혀처럼 빨간 자동차 불빛들이 널름대고 있다. 그 여자는 창에서 돌아서면서 깨금발로 부엌 마루로 올라서면서 자기의 발이 맨발인 것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그 발은 좀 슬퍼 보인다. 발은 묘하게 침묵하고 있다. 마치 그 여자의 것이 아닌 듯이 어둠 속에 달랑 나앉은 듯한 발, 그 여자는 양말을 하나 찾아 신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맨발과 차디찬 유리창의 감촉은 순간 그 여자에게 시 한 편의 욕망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레 그 여자를 식탁 앞에 앉게 햇다. 식탁 위에선 그날도 종이와 볼펜이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고요히 어둠의, 침묵의 말을 받아 쓰기 시작했다. ‘아마 곧 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귤 몇 알을 들고 그가 곧 들어오리라.’ 그러나 그날도 이미 12시가 넘었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를 그 시의 끝에 모시고 왔다.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그대 등 뒤에 있다’라고.
글쎄, 왜 그랬는지........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었을까. 그 여자가 여학생 시절, 늘 문 밖에 나와 그 여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골목을 돌아서면 대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가 보이고, 그 아버지의 등 뒤에는 큰 하늘이 있곤 했다. 그 하늘은 순간 그 여자에게로 뛰어들어왔었다. 마치 어둠 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나 큰 말이 그 속에 있는 거대한 ‘침묵의 판’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사랑법’은 삶의 道이다. 기다림의 구름이 앉아 있는 삶의 道. 그런데 이젠 나를 골목 앞에서 기다려 주시던 분도, 자정이 되어야 달려오던 귤 한봉지도 더 이상 달려오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아마도 최후의 대답일 기다림도 그이들은 가져가 버렸나.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는’ 더 큰 기다림, 아, ‘침묵’만을 남겨두고.
- 강은교 시인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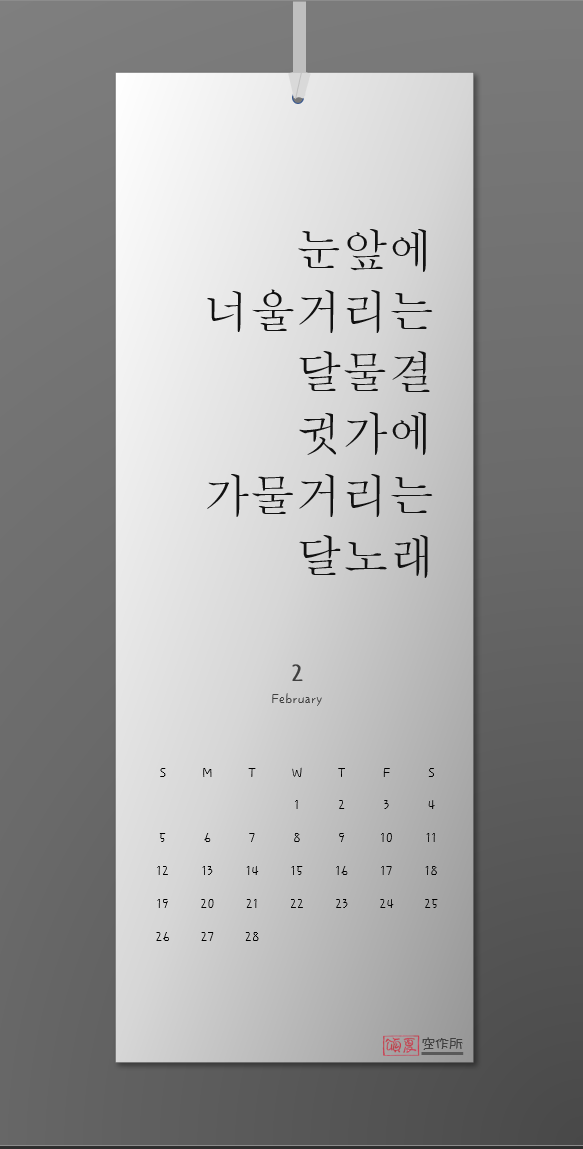
'시인과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의 詩: 소용돌이 (16) | 2023.04.16 |
|---|---|
| 3월의 詩: 열린 전철문으로 들어간 너는 누구인가 (12) | 2023.03.04 |
| 1월의 詩: 지금 여기가 맨 앞 (8) | 2023.01.08 |
| 12월의 詩: 4월 (6) | 2022.12.03 |
| 11월의 詩: 폭우와 어제 (22) | 2022.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