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글씨로 내 이름을 써두곤 했다
당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깊어진 글씨로
내 이름을 써두곤 했다
나 혼자 노을 속에 남겨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당신 맨 처음 바라보라고
서쪽 하늘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청동의 별 하나를 그려두기도 하였다
때로는 물의 이름을
때로는 나무의 이름을
때로는 먼 사막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지붕이 자라는 밤이 와서
하늘이 내 입술과 가까워지면
푸른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장 깨끗한 언어로
당신의 꿈길을 옮겨 적기도 하였다
내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물고기 한 마리
우산을 쓰고 지평선을 넘어오는 자전거 하나
밤과 새벽을 가르는 한 올의 안개마저
돌아와 아낌없이 반짝이곤 했다
아무도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글씨로 당신 이름을 쓰기도 했다
아무도 그 이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세상에 없는 글씨로 당신 이름을 쓰기도 했다
날마다 뼈를 허물어 등불을 매달았으나
당신 한 번도 내가 쓴 말들 보지 못했다
빈 정거장에 나아가 눈이 먼 은행나무처럼
그토록 가깝고 먼 자리에
무성히 가지를 뻗은 지우개가 늘 있었다
「칠판」
류근 詩集 『상처적 체질』 (문학과지성, 2010)
(······)
나는 그녀가 쓴 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느 모자를 쓰든 그녀의 아름다움은 훼손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흐르든 "이젠 모자를 좀 벗는게 어때?"라고 말하지 않기. 그 응시와 침묵이 내 편에서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언강에서 겨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와 그녀는 한참 강 앞에 머물다가 문득 심장을 내려 앉히는 큰 울림을 들었다. 먼 산속에서부터 오는 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눈앞의 강 깊숙한 곳에서 얼음이 녹아 부서지는 소리였다.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두렵고도 아름다웠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그랬을 것이다. 방금 들었던 소리가 환청으로 느껴질 만큼, 언 강은 견고한 모습 그대로였다.
어쩌면 강도 영영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 소리를 얼려두나 보다. 어느 깨 산과 땅을 울리도록 그리운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며, 얼음 모자를 쓰고 있는지도.
우리는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기를 바라면서 말없이 서 있었다. 더없는 겨울의 마음으로.
<추운 계절의 시작을 믿어보자> 부분
한정원『시와 산책』(시간의흐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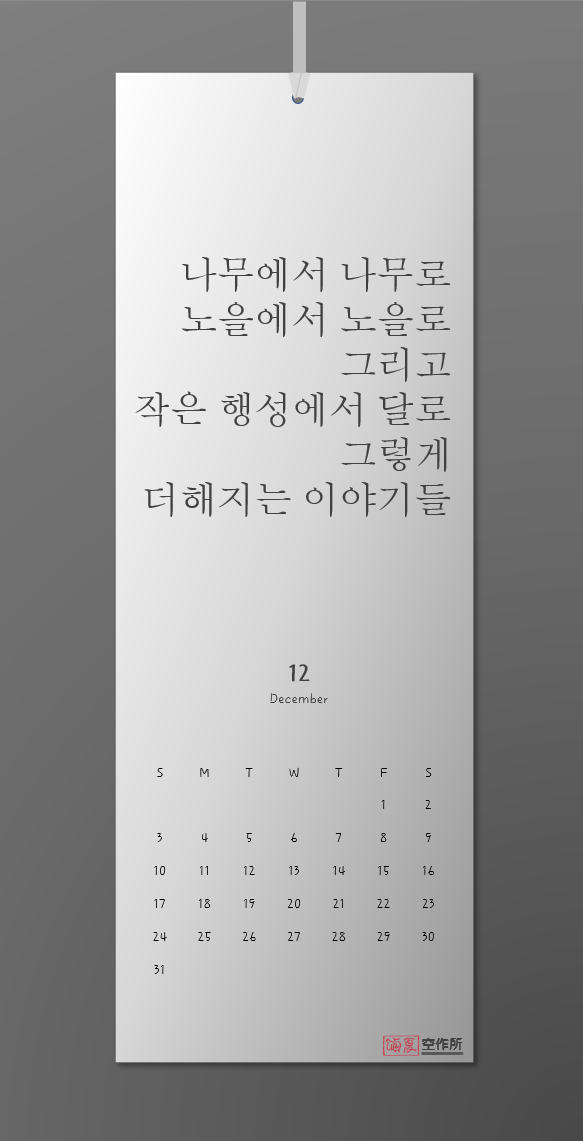

당신과 내가 얼굴에 입이 반, 그리고 또 눈이 나머지 반의
반인 세상으로 한세상 그렇게 어울려 기대어 버티어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네 상처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약속도 없는
생애까지 파랗고 하얗고 노랗게 남김없이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 저녁이었으면 좋겠네
또는 아무 때나 아침이 오고 내일이 와서 다음 생의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네 사람아,
「김점선의 웃는 말 그림 판화」
류근 詩集 『어떻게든 이별』 (문학과지성, 2016)
'시인과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가 내 얼굴을 만지네 (6) | 2025.04.27 |
|---|---|
| 11월의 詩: 처용 3장 (6) | 2023.11.24 |
| 10월의 詩: 가을 편지 (18) | 2023.10.15 |
| 9월의 詩: 가을 기차 (9) | 2023.09.09 |
| 8월의 詩: 노을 말고, 노을 같은 거 (22) | 2023.0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