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는 왔고 이 세기의 어느 비닐영혼인 나는 말한다, 빌딩 유리 벽면은 낮이면 소금사막처럼
희고 밤이면 소금이 든 입처럼 침묵했다 심장의 지도로 위장한 스카이라인 위로 식욕을 잃어
버린 바람은 날아갔다
너는 왔고 이 세기의 모든 비닐영혼은 말한다, 너, 없이 나는 찻집에 앉아 일금 3유로 20센
트의 희망 한 잔을 마셨다, 구겨진 비닐영혼은 나부꼈다, 축축한 반쯤의 태양 속으로
너는 왔는데도 없구나, 새롭고도 낡은 세계 속으로 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잃었고
아버지의 기일에 돋는 태양은 너무나 무서웠다
너는 왔고 이 세기의 비닐영혼은 말한다, 네 손에서는 손금이 비처럼 내렸지 네가 왔을 때 왜
나는 그때 주먹을 쥐지 않았을까, 손가락 관절 마디마다 돋아드는 그림자로 저 완강한 손금비를
후려치지 않았을까
너는 왔고 이 세기의 생존한 비닐영혼은 손금에서 내리는 비를 피하려 우산을 편다 너, 없이
희망이여 몇 백 년 동안 되풀이된 항의였던 희망이여 비닐영혼은 억울하다,
너, 없이 희망과 함께
「너, 없이 희망과 함께」
허수경 詩集『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문학과지성, 2016)
희망하면 희망하게 되고 욕망하면 욕망하게 되는, 眞空(진공)의 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고요해진 여기 나는 멈춰 서서 너를 생각한다. 그리운 것은 항상 기다리는 동안 오지 않았고 막상 도착하고 나면 기억에서 잊혀져 알지 못하고 지나기 일쑤였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서 언젠가 천천히 낭하로 내려가다 보면 한번은 너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럴때면 나는 맑고 투명했던 신비한 모래의 춤을 기억하고, 몰운대 물 속에서 불타오르던 해지는 일몰을 기억했다. 누구에게나 위대한 正午가 있다고, 희망이야, 바보야. 발을 헛디뎌 한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시 몸을 일으키면 찰나에 스쳐가는 허무, 그 너머의 길이야. 여기 한낮에 異邦(이방)의 거리에서 묵묵한 정오의 그림자와 함께 나에게 이야기하던 너. 그 교차첨에서 네가 얘기했던 희망은 내 삶의 빗살무늬가 되었지만 眞空의 시간이 끝나고 고요가 움직이는 동안 너의 그림자도 지워져 버렸다. 그렇게 너를 잃어버린 시간 나는, 시간의 낭하에서 밤마다 등을 켜고 어둠을 비켜내며 울음우는 슬픔으로부터 너의 잠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불릴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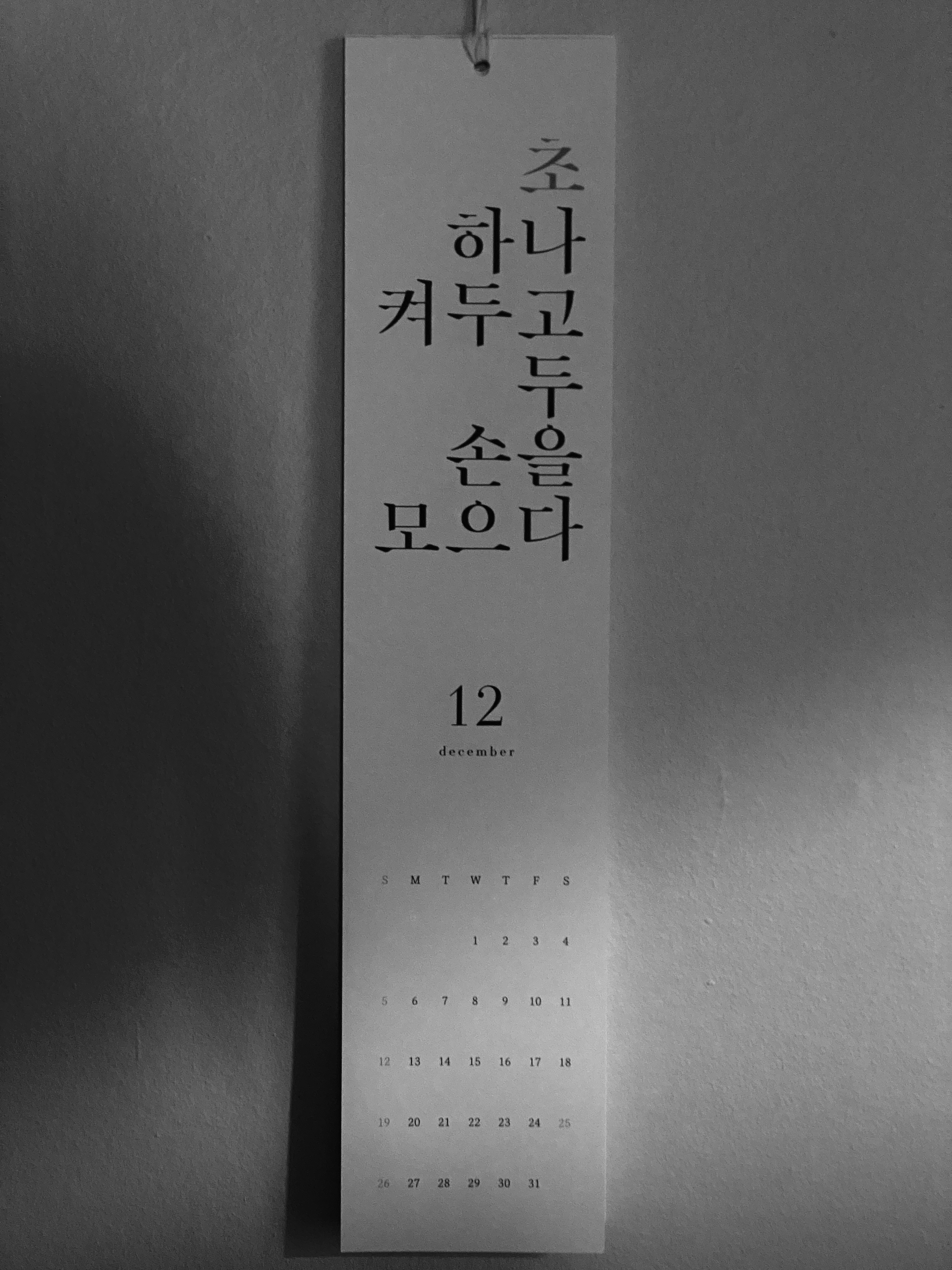
'시인과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월의 詩: 인사 Salut (21) | 2022.02.09 |
|---|---|
| 성녀(聖女) - 스테판 말라르메 (8) | 2022.01.30 |
| 11월의 詩: 걸리버 (31) | 2021.11.30 |
| 어떤 경우 (12) | 2021.11.12 |
| 10월의 詩: 가을의 소네트 (28) | 2021.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