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찍 맺힌 산당화 꽃망울을 보다가
신호등을 놓친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는 영화의원 앞
신호등을 제때 건너지 못한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운에 취해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듯하다
언젠가는 찾아 헤맬 수많은 길들이
등 뒤에서 사라진 듯하다
서슴없이 등져버린 것들이
기억 속에서 앓고 있는 곳
꽃망울이 기포처럼 어린 나를 끓게 하던 곳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꽃나무 어딘가에 있는 듯
나는 신호등을 놓치며
자꾸 뒤를 돌아본다
「일찍 피는 꽃들」
조은 詩集 『생의 빛살』 (문학과지성, 2010)
화사한 봄날, 꽃대궁 밀어내는 꽃은 스스로를 뒤집어 삶의 내면을 햇살에 내어놓는다. 삶의 순간이 다할 때까지 이 모든 속과 겉, 안과 밖의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마치 삶의 슬픔을 밖으로 밀어내며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처럼 꽃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꽃을 만들어 낸다. 키가 더 크지 않게 된 이후로 나는 스스로 둥글게 꽃씨처럼 잠을 자야했고 슬픔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었다. 바느질이 성하지 않는 솔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둑우둑 튿어지는 삶을 묵묵히 견뎌내며 나는 슬픔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백화제방, 백가지 꽃들이 만발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슬픔들이 그 꽃들마다 매달려 끝없는 진동의 空中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空中의 텅 빈 방 안에 내 등 뒤로 사라졌던 길들이, 사람들이 보인다.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너머 어린 꽃망울로 숨쉬던 내가 미소를 짓는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봄날을 울었다.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어 웅성거리며 너무 일찍 핀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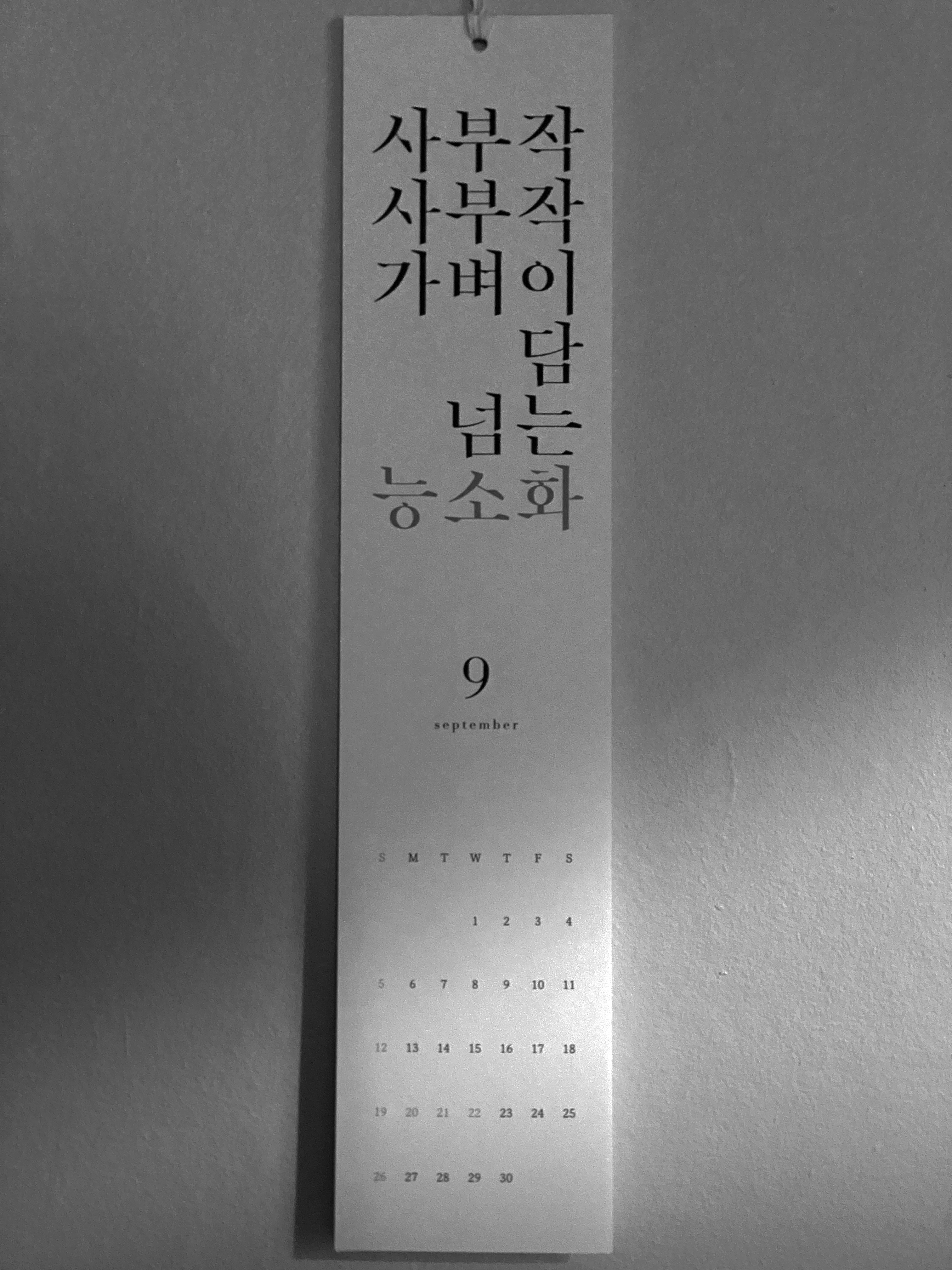

'시인과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떤 경우 (12) | 2021.11.12 |
|---|---|
| 10월의 詩: 가을의 소네트 (28) | 2021.10.17 |
| 8월의 詩: 추운 여름에 받은 편지 (4) | 2021.09.05 |
| 오래 전의 일 (4) | 2021.08.07 |
| 7월의 詩: 슬픔없는 앨리스는 없다 (4) | 2021.07.24 |

